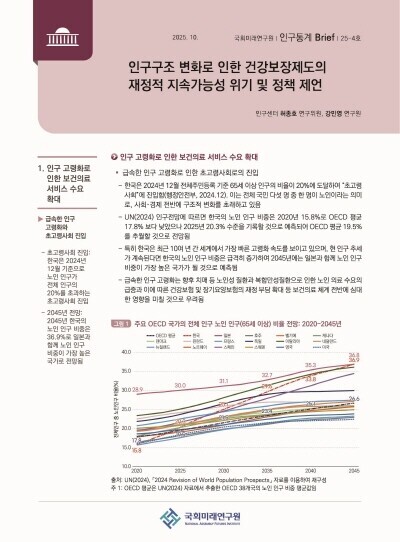[입법정책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전임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테러 등으로 다수의 국무위원이 궐위될 경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 명시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국무회의 공개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가 안정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먼저 국무회의의 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은 정족수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국무회의의 개의·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만 담겨 있다.
또한 정족수 산정 기준을 '구성원'이 아니라 '재적 국무위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경우 해임이나 사퇴로 결원이 발생하면 전체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족수 충족이 한층 수월해진다.
아울러 국무위원의 궐위나 사고로 생기는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의 직무대행 규정은 있으나, 국무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차관이 국무위원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국무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법적으로는 회의록이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