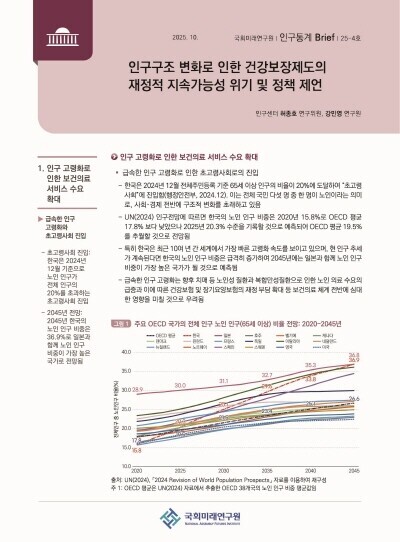[입법정책뉴스]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여전히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행정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필수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허가 없이 입국했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또는 ▲그러한 부모 사이에서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확한 규모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17년 법무부 연구에서는 5,295명에서 최대 1만 3,239명으로 추정됐으나, 최근에는 2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이 '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은 어떤 신분이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방임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국내 정책 흐름과 주요 조치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교육권 확대 △통보의무 면제 △체류자격 부여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2006년, 2010년, 2013년 법무부의 조치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입국 서류가 없어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게 됐다.
2011년에는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유치원·학교·의료기관·보호조치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2022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미등록 아동과 부모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2023년)와 전북 남원시(2024년)는 아동 발굴·등록·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
입법조사처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나라가 참고할 점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교육과 응급의료는 가능하지만 복지혜택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불법체류자에게 ‘체류특별허가’를 부여하되, 복지서비스는 제한하고 교육과 예방접종 등 기본 서비스만 허용한다.
프랑스는 인도주의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를 허용하지만, 가족수당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독일은 추방유예(관용) 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현실과 해외 사례를 종합해 ▲아동 등록 및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상설화(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등록 아동 등록 시 체류자격(D-4 비자) 부여 제도를 상시화해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필수 보호서비스 제공(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아동에게도 △응급의료 및 예방접종 △무상·의무교육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구제 등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출생등록권·보육권 논의의 단계적 추진(출생등록권 보장과 보육료 지원은 헌법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등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 과제"라며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되, 불법체류를 조장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