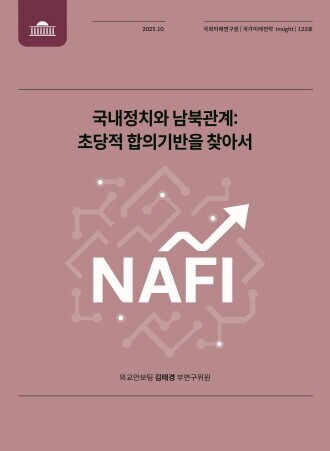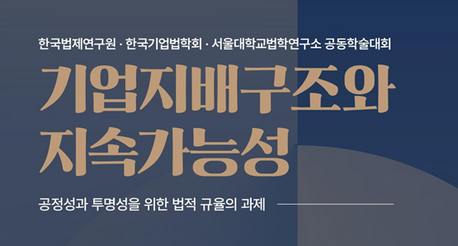[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3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실손보험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연계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약 133조 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86조 원(65%), 환자가 33조 원(25%), 실손보험이 14조 원(11%)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같은 해 20조 원으로, 지난 13년 동안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CT·MRI 같은 의료적 비급여 항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용성형, 도수치료, 수액치료 등 비의료적 항목이 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제공하며 수익을 늘리고 있어,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3년 기준 약 4,000만 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8%에 달한다. 특히 최근 3·4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각각 128.5%, 111.9%로 100%를 넘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급된 보험금의 약 60%가 비급여 의료비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실손보험이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좁고 비급여 항목이 다양해 환자의 부담이 크고, 민간 실손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비급여 확산의 구조적 원인을 건강보험 도입 초기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정책과, 2000년 통합 이후 지속된 저수가 기조,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 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하는 포괄주의 원칙에서 찾았다.
현재 건강보험(복지부)과 실손보험(금융당국)의 이원 관리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비급여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법·제도 측면의 의료법은 "최선의 의료 제공"을 강조하지만, 건강보험법은 "비용 효율적인 진료"를 우선하도록 해 현장에서는 괴리가 발생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환자들은 의료진 권고에 의존하며, 실손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게 된다.
공급자 측면의 의료기관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자유롭게 비급여 가격을 책정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며 수익을 극대화한다. 일부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최대 62.5배에 달한다.
보험업계 측면은 상위 9%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는 등 과다 이용 현상이 나타나고, 초과 공단부담금은 3.8조~10.9조 원에 이른다.
정부 정책 측면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진료량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정책 효과가 줄어든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관리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입법정책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